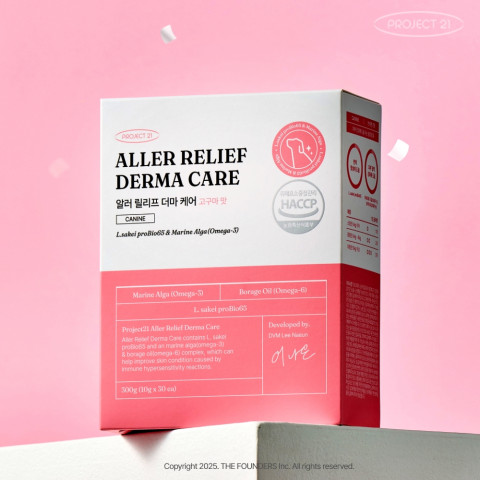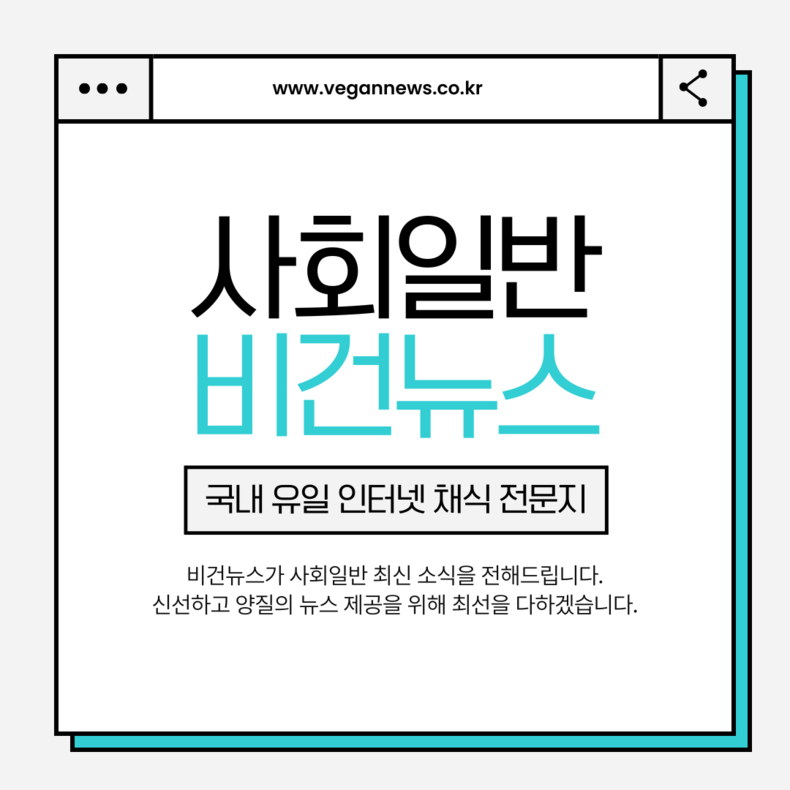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마다 설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이 상이해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을 획일화할 경우 청년 수가 늘어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자치단체는 청년을 19세부터 39세까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강원과 전남은 청년 기준을 18세부터 45세로 정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 기준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 대전 동구와 중구는 34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는 반면, 충남 홍성과 충북 괴산, 단양에서는 49세까지 청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정책 수혜자를 늘리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처럼 지역마다 다른 청년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21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총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그 중 상당수는 청년 연령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정책 수혜자의 혼란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청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 제도와 법령 간 충돌의 우려도 상존한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 기준을 15세에서 29세로 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15세에서 34세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30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공론을 통해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고, 소외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논의는 청년 정책의 미래와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