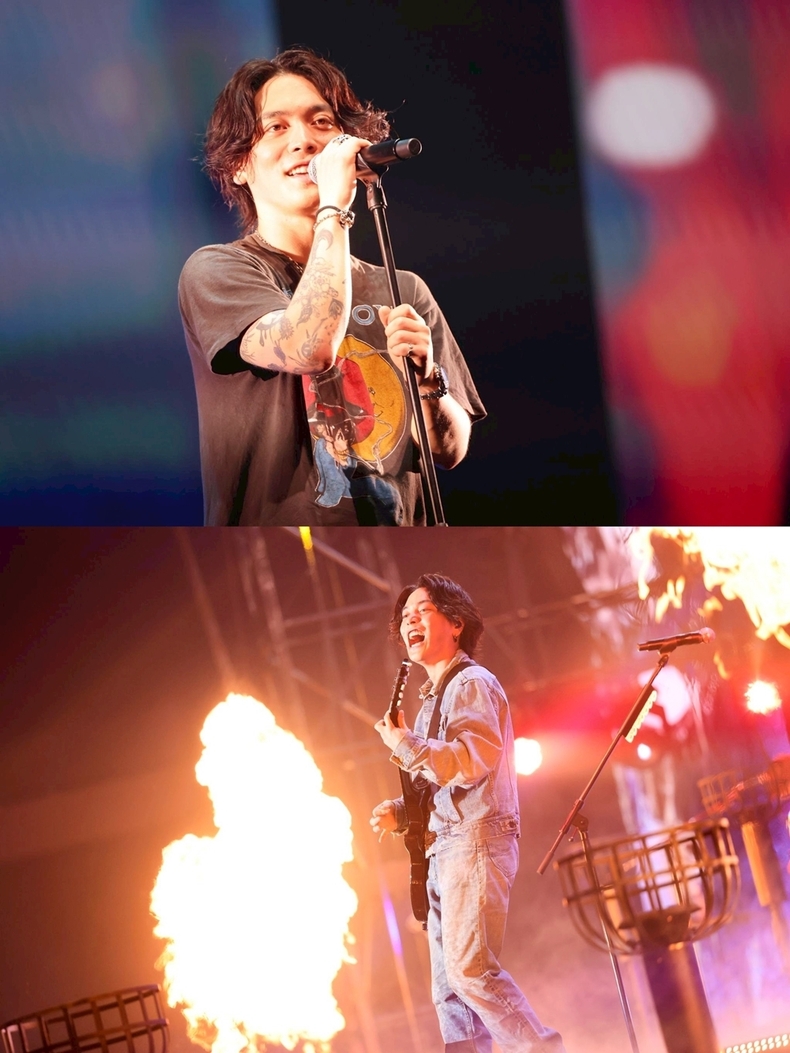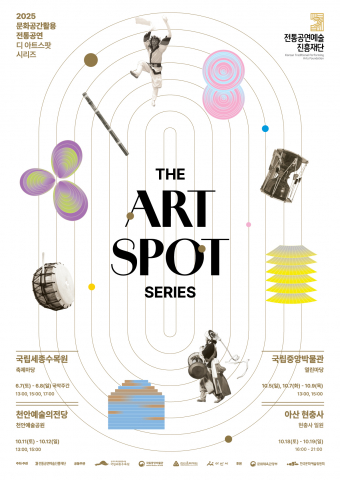![(사진제공=UNIST) [연구진사진] 정성균 서울대교수, 김동혁 UNIST 교수, 홍지현 POSTECH 교수, 박찬현 박사, 최진규 연구원, 박서정 박사(이상 UNIST)](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10/3400132_3531242_2639.jpg)
(울산=국제뉴스) 주영곤 기자 = UNIST(총장 박종래) 에너지화학공학과 김동혁 교수, 서울대(총장 유홍림) 첨단융합학부 정성균 교수팀, 그리고 POSTECH(총장 김성근) 홍지현 교수팀은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기반 전고체전지의 양극·전해질 계면 안정화 기술을 개발하고, 전지 열화 거동을 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차세대 전기차와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고체전지(All-Solid-State Battery, ASSB)의 상용화를 앞당길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전고체전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와 달리 가연성 액체 전해질 대신 불연성 고체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그러나 양극과 고체전해질이 직접 맞닿는 계면에서 화학적 분해와 구조적 손상이 발생해 성능과 수명이 빠르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튬 디플루오로포스페이트(LiDFP)를 활용해 양극 표면에 코팅층을 형성한 모델 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고체전지의 열화 거동을 정밀 분석했다. 특히 머신러닝,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그리고 첨단 분석 기법을 도입해 양극과 전해질 사이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열화(분해 반응)가 양극 입자의 반응 균일성과 미세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입자 단위부터 전극 단위까지 추적·규명했다.
분석 결과, 코팅층이 적용된 양극에서는 화학적 열화가 크게 억제되고 입자 간 반응이 더욱 균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계적 열화 역시 전극 전반에 고르게 분포하면서 특정 부위의 집중적인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용량 유지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전고체전지의 장기간 구동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그동안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낮은 구동 압력 문제 해결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코팅층이 단순히 표면을 덮는 보호막에 머무르지 않고 계면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억제하는 동시에 리튬 이온 전달 경로를 유지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코팅 소재가 전지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리튬 이온 전도 특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제1저자인 박찬현 박사(前UNIST 에너지화학공학, 現 독일Justus-Liebig University Giessen 박사후 연구원)는 “이번 연구는 전고체전지 성능 저하 원인을 양극 입자 단위에서 전극 단위까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물”이라며, “코팅 소재의 역할이 단순한 화학 반응 억제를 넘어 새로운 리튬 이동 통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했고, 전고체전지 열화 거동 이해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가 전고체전지의 성능 저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고성능·장수명 전지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산업통상자원부 기술 혁신 프로그램, 한국연구재단 신진 연구사업, 포스코펠로우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차전지혁신연구소, 이차전지 전해질 생산 업체인(주)천보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3일 에너지 소재 분야 권위적 국제 학술지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논문명: Interfacial Chemistry-Driven Reaction Dynamics and Resultant Microstructural Evolution in Lithium-based All-Solid-State Batteries)
※ 붙임: 연구결과개요, 그림설명
□ 연구 결과 개요
1. 연구배경
본 연구에서는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전지에서 양극·전해질 계면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열화와 그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정밀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머신러닝 기법,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법 그리고 다양한 첨단 실험 분석을 접목하여, 화학적 반응이 양극 입자의 반응 균일성과 미세구조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리튬 디플루오로포스페이트(LiDFP)를 활용하여 양극 표면에 비분해성(non-decomposable) 코팅층을 형성한 모델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이 코팅층은 전해질과의 화학 반응을 억제하면서도 계면 보호층의 조성 변화가 없는 코팅소재로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계면 화학 반응이 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과 구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코팅층이 적용된 양극은 화학적 열화가 크게 감소하며 입자 간 반응이 균일하게 나타났으며 기계적 열화 역시 양극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여 특정 부위의 집중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코팅이 없는 경우에는 화학적 분해가 심화되면서 양극 입자 간 반응 불균일성이 증가하고, 국소적인 기계적 손상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구팀은 전고체전지에서 성능저하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활물질 표면에서의 화학 반응성의 차이가 활물질 입자단 및 전극단에서의 기계적 열화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 이는 코팅층이 단순한 보호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리튬 이온 전도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성과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전지에서 양극·전해질 계면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열화와 그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정밀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머신러닝 기법,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법 그리고 다양한 첨단 실험 분석을 접목하여, 화학적 반응이 양극 입자의 반응 균일성과 미세구조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리튬 디플루오로포스페이트(LiDFP)를 활용하여 양극 표면에 비분해성(non-decomposable) 코팅층을 형성한 모델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이 코팅층은 전해질과의 화학 반응을 억제하면서도 계면 보호층의 조성 변화가 없는 코팅소재
로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계면 화학 반응이 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과 구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코팅층이 적용된 양극은 화학적 열화가 크게 감소하며 입자 간 반응이 균일하게 나타났으며 기계적 열화 역시 양극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여 특정 부위의 집중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코팅이 없는 경우에는 화학적 분해가 심화되면서 양극 입자 간 반응 불균일성이 증가하고, 국소적인 기계적 손상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3. 기대효과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구팀은 전고체전지에서 성능저하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활물질 표면에서의 화학 반응성의 차이가 활물질 입자단 및 전극단에서의 기계적 열화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 이는 코팅층이 단순한 보호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리튬 이온 전도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성과다.
□ 그 림 설 명
![[연구그림] 열화 원인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진이 사용한 모델](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10/3400132_3531237_252.jpg)
그림1. 정량적 미세구조 분석을 위한 2D FIB–SEM 이미지 기반 디지털 트윈3D 양극 복합체 재구성 모델.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양극 복합체 내 양극입자 및 양극입자 표면에 형성된 공극 정보 추출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news00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