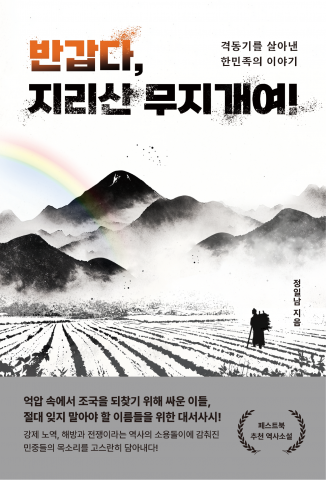◆ 혼인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을 전합니다.
고문서 중에는 관청에서 만든 공문서도 있지만, 개인의 삶과 감정이 고스란히 스며든 사문서(私文書)도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1666년, 조선시대 혼인 관습 속에서 작성된 한 장의 “혼서지(婚書紙)”를 소개한다. 이 문서는 2016년 6월 (주)코베이옥션 ‘삶의흔적’ 프리미엄 경매전에 출품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혼서지는 전(前) 목사(牧使) 해주인(海州人) 오상(吳翔, 1606~1657)이 조카 오두인(吳斗寅, 1624~1689)의 혼인을 허락해 준 황(黃) 풍천(豐川) 댁에 감사를 전하고자 보낸 문서다. 오두인은 조선 후기의 명망 있는 문신으로, 문과 별시 장원급 제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 혼인은 그의 젊은 시절, 세 번째 혼사에 해당한다.
재미있는 점은 혼서지에서 오두인을 “조카[姪]”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상은 오두인의 생부였지만, 오두인이 백부(伯父) 오숙(吳䎘, 1592~1634)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에 당시 예법에 따라 오상이 “조카”로 지칭한 것이다. 오두인이 오숙에게 입양된 것은 오숙에게 후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혼서지가 작성된 1666년 당시에는 이미 오숙이 사망한 뒤였으므로, 생부이자 족보상으로는 숙부가 된 오상이 혼주(婚主)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입양은 가문을 잇기 위한 제도였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감정적으로 무던했으리라고 보긴 어렵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큰 형의 자식으로 삼아야 했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부자 관계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족보 질서로 들어가야 했던 아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남기지 않은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서에서는 사사로움을 지우고, 예법과 예우에 충실한 정중한 언어만이 남아 있다.
문서에는 “존후(尊候)에 만복(萬福)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라며 상대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인사로 시작된다. 이어 “훌륭한 따님으로 하여금 조카 오두인과 혼인하도록 허락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선인의 예에 따라 삼가 납폐(納幣)를 행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봉투[봉피]도 함께 전해졌으며, 겉면에는 “상장(上狀)”, “황 풍천 댁”, “근봉(謹封)” 등의 문구가 쓰여 있다.

◆ 조선시대 납폐, 그리고 문서로 전하는 정례(定禮)
조선시대의 혼인은 단순한 개인 간의 연애나 약속이 아니었다. 이는 가문과 가문이 맺는 관계이자, 예법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의례였다. 그 절차는 크게 여섯 단계로 나뉘는데, 납채(納采) → 문명(問名) → 납길(納吉) → 납폐(納幣≒納徵) → 청기(請期) → 친영(親迎)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혼서지’는 네 번째 단계인 납폐(納幣) 때 작성되는 문서다. 이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서신과 폐물(幣物)을 보내어 정혼이 성립됐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예서(禮書)다. 서신에는 혼인을 허락해 준 데 대한 감사, 양가의 관계, 예물의 전달 사실이 정중하고 간결하게 담긴다. ‘혼서지’는 단지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문서가 아니라, 혼인을 매개로 한 감정과 예의의 교환이 문서로 만들어진 기록이기도 하다.
결혼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큰 전환점이었고, 그만큼 양가 모두의 긴장과 정중함도 컸을 것이다. 친정을 떠날 딸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 조카의 혼사를 정중히 주재해야 했던 작은 아버지로서의 입장, 그리고 입양된 아들이 자신의 가문을 넓혀가는 자리에서 느꼈을 복합적인 감정들까지 - 그 모두가 이 한 장의 문서에 말없이 담겨 있다. 조선의 예서는 무정하지 않았다. 다만 말 대신 글로, 감정을 절제된 언어로 옮겼을 뿐이다.
◆ 문서 한 장에 담긴 정중함의 품격
이 문서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크기는 가로 77.3cm, 세로 56.5cm로 대형이며, 담긴 필체는 정제된 해서체로, 한 자 한 자에 신중함이 배어 있다. 내용에는 과장된 수식 없이 간결한 감사와 납폐의 의례만이 담겨 있어, 당대 혼례 문서의 형식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문서 어디에도 신부의 부친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문서 작성 관례에 따른 것으로, 상대 집안을 특정 인명 대신 “○○댁” 또는 “본관+지역” 형식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즉, “황 풍천 댁”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신부의 본관과 가문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해주오씨세보’에 따르면, 오두인의 장인어른은 황연(黃埏, 1604~?)으로 확인된다. 본관은 상주(尙州)이고, 자는 중후(仲厚)이며, 1651년 무과 별시에서 병과로 급제한 인물이다. 문서가 매우 정중하게 작성된 점으로 보아, 이 혼인은 정실부인을 맞이하는 혼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황연의 딸은 오두인의 세 번째 부인이었다. 다만, 혼례 당시, 앞선 두 부인의 생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고문서 한 장은 단순한 종이에 그치지 않는다. 거기에는 시대의 관습과 예법, 그리고 각기 다른 삶을 살아낸 이들의 감정이 함께 아로새겨져 있다. ‘혼서지’라는 이 문서는 조선이라는 시대가 남긴, “결혼”이라는 삶의 순간을 기록한 가장 아름다운 서간(書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디지털 청첩장 한 장으로 결혼 소식을 전하는 오늘날,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관계를 맺는 일에 과연 어느 정도의 정중함과 마음을 담고 있는가? 형식은 달라졌지만, 누군가에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옛사람들의 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 오늘의 의례 속에서 “품격 있는 감정 표현”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