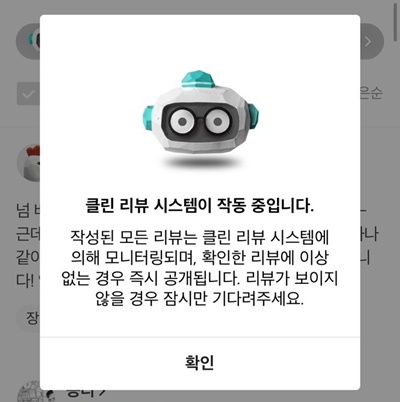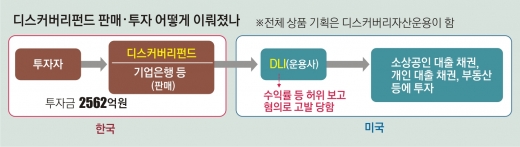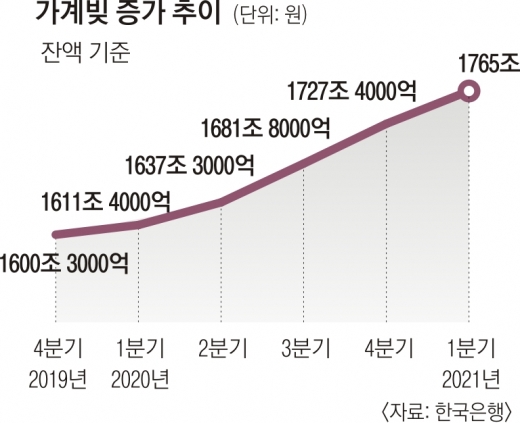(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임차인이 "곧 나가겠다"고 말했는데도 점유가 계속되는 순간, 임대인의 마지막 수단은 결국 명도소송(인도청구)을 통한 강제집행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아놓고도, 정작 집행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판결문(또는 조정조서·제소전화해조서)에 '특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8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판결이 결승선이 아니라, 집행 가능한 문구로 완성되는 절차"라며 "퇴거 날짜와 인도 대상이 모호하면 집행문 부여, 집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집행관의 답을 듣게 된다"고 말했다.
명도 판결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대충' 적은 인도 시점이다. 예를 들어 판결 주문에 '계약 종료일 이후 인도' '판결 확정 후 인도'처럼 추상적 표현만 남으면, 상대방이 시간을 끌 때 집행 개시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생긴다.
집행은 결국 문장 하나로 움직인다.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버티는 동안 임대인은 다시 추가 절차(확정일자 확인, 조건 성취 여부 다툼, 집행문 부여 관련 이의 등)로 시간을 소모하기 쉽다.
또 다른 함정은 인도 대상의 특정 부족이다. '해당 건물' '점포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 구역까지가 대상인지", "창고·테라스·별도 출입문 공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다. 특히 상가나 다가구·복합건물에서는 호수, 층, 전유부분 범위가 흔들리면 집행관이 물리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임대인 입장에선 승소했는데도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지연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장 단계부터 집행을 전제로 한 특정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는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대로 정확히 기재하고 ▲점유 범위를 호수·층·전유부분 중심으로 특정하며 ▲인도 시점을 "○○년 ○월 ○일까지"처럼 달력 날짜로 끊어 두는 방식이 분쟁을 줄인다. 합의에도 마찬가지다. '언제 나간다'는 약속이 아니라, 집행권원에 들어갈 문장으로 확정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구조다.
엄 변호사는 "명도 사건에서 임대인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승소했는데 못 비우는 상태'"라며 "판결·조정·제소전화해 모두 효력의 문제라기보다, 집행 단계에서 문구가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돼 있는지가 승패를 가른다"고 말했다.